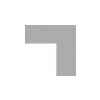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황릉몽환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로, 두 명의 선비 계암과 경암의 입몽과 각몽, 그 사이에 있는 몽중 세계의 이야기를 그리는 몽유록 작품이다.
어느 날, 중국의 소상강을 유람하던 계암과 경암은 순임금을 따라 절사(節死)한 아황과 여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두 선비는 꿈속에 홀연히 나타난 한 여자아이의 손에 이끌려 황릉묘에 가게 된다. 아황과 여영을 비롯해 황릉묘에 자리하고 있던 역대 현부와 열녀들은 두 선비에게 수난에 찬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난 두 선비는 이후 세상에 뜻을 잃고 은둔했다는 것이 《황릉몽환기》의 주요 골자다.
일반적으로 몽유록은 남성 독자를 중심으로 향유됐던 양식이다. 몽중 세계에서 중심에 놓인 인물도 대개 남성이며,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의 양상을 띤다. 《황릉몽환기》는 이러한 몽유록의 전형성을 크게 벗어나 있다. 《황릉몽환기》의 중심에는 여성 인물이 놓여 있으며,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정에의 호소에 기대어 있다. 역사서에 기록될 수 없었던 여성의 개인사. 잘못된 세평에 대한 항변. 이를 들은 두 선비가 공감하며 교감한다는 독특한 서사 방식을 채택한 《황릉몽환기》는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드물게 ‘여성의 반론’을 그린 작품이라 할 것이다.
학계에는 이미 30년 전에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일반 독자를 위한 번역서가 나오지는 못했다. 전하는 이본들에 낙장이 있거나 원래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 등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황릉몽환기》의 새로 발굴된 이본인 《양협사몽유록(兩俠士夢遊錄)》을 저본으로 삼았다. 기존의 이본에 나타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완질본이다. 《황릉몽환기》의 모든 이본을 정밀하게 검토한 유요문 교수가 그간 해독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밝혀내 첫 완역으로 소개한다.
200자평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조선의 두 선비 계암과 경암은 서로의 곡조를 이해하는 막역한 친구 사이. 어느 날, 중국의 소상강을 유람하던 이들은 순임금을 따라 절사(節死)한 아황과 여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두 선비는 꿈속에 홀연히 나타난 한 여자아이의 손에 이끌려 황릉묘에 가게 된다. 아황과 여영을 비롯해 황릉묘에 자리하고 있던 역대 현부와 열녀들은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난에 찬 인생 이야기를 들려 주는데…. 아황과 여영을 만난 두 선비의 꿈 이야기, 《황릉몽환기》를 초역으로 소개한다.
옮긴이
유요문은 198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국문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 청주대, 경기대, 안동대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분야는 고전소설이다. 동아시아 및 한국의 고전서사에 나타난 이념 양상과 기존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콘텐츠 방면으로 연구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태평광기》에 나타난 악인의 양상과 그 수용의 의미〉(2021),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딜레마 상황과 그 반복의 의미〉(2022), 〈웹소설 〈소녀, 홍길동〉(2019)의 남장 서사와 그 낭만적 주체의 문제 : K−서사 정립을 위한 고전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24) 등이 있다.
차례
옮긴이 서문
황릉몽환기
필사기
원문
해설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樓) 위에서 진주로 만든 발이 일시에 치워지니 그 소리 쟁쟁했다.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니 두 사람이 술과 안주에 기대 잠깐 졸았던 것이었다. 이때 은하수는 말똥말똥하고 새벽달은 서리와 이슬처럼 희었으니 자못 처량하고 슬펐다. 이후 꿈에 있던 일을 서로 얘기했는데 기이하고 황홀해 다시는 자연 물색과 경치를 보는 일에 뜻이 없어졌다. 적막한 가운데 찬 기운을 느껴 훌훌 털고 돌아오니 이미 초겨울 소한(小寒)의 계절이더라. 시든 국화는 괴롭게 주인을 기다리고 누렇게 변한 나뭇잎은 쓸어버릴 사람이 없었으니 처량하고 슬픈 자연과 냉담한 경치가 두 사람의 근심을 더욱 거드는 듯하더라.
– 50쪽.
(…) 양이 많지 않으나 성현·현비와 열녀·절부들의 사적이 대강이라도 기록되었으며, 상비와 주비 두 성인의 덕이 하늘 같고 만승(萬乘)이나 되는 부귀를 갖고 있지만 슬픔이 있어 유한(遺恨)한 고통이 있다 하셨다. 그러니 하물며 얻지도 못하고 덕도 없고 복도 없는 우리 여자들은 어떠하리오? 슬픔과 원망이 극분(極憤)한 내 아이 정 아무개야. 자고로 열녀와 효절을 가진 여자 중 아까운 자질을 가지고도 한두 가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한두 가지 즐거움도 없었던 자가 많았으니 어찌 가련하고 슬프지 아니하리오?
– 필사기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