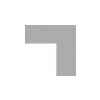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인간만이 연극을 한다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까?
AGI가 감정과 욕망을 시뮬레이션하고 인간처럼 결정하며 연극 무대 위에 등장하는 시대를 맞아 이제 ‘연극은 인간만의 예술’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AI가 극본을 쓰고 감정을 연기하며 관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연출을 조정하는 무대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무엇이 연극인가? 누구를 위한 연극인가?
연극은 끝났는가, 혹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가
《AGI, 연극 이후의 연극》은 기술이 연극을 대체하는가 하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연극이라는 예술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어떻게 변형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성찰한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서 AGI 배우까지, 햄릿 3.0과 노라 3.0에 이르기까지 고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인간성과 연극성의 경계를 다시 묻는다.
‘연극 이후의 연극’은 기술적 완벽성 너머에 여전히 남겨지는 인간적 잉여, 예측할 수 없고 불완전한 예술로서의 연극을 말한다. 이 책은 AI가 구현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오류’, 실패와 반복, 분열과 비재현의 순간에서 연극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를 통해 인간만이 지닌 불완전함과 그로 인한 창조적 가능성을 재확인한다.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시대에 연극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발명되어야 할 실천임을 강조한다.
200자평
AGI(인공 일반 지능)가 감정과 욕망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시대, 연극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다. AI가 배우가 되고 연출가가 되며 관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지금, 연극은 새로운 존재론적 전환의 기로에 선다. 이 책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연극, ‘연극 이후의 연극’에 대한 치열한 사유를 담았다. AI는 연극의 종언을 고할 것인가, 연극의 본질을 새롭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인가?
지은이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부산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든 순간의 인문학》, 《연행을 통한 문학교육》, 《이토록 영화 같은 당신》 등을 썼고, 논문으로는 “메타극의 공연기호학적 소통 과정”, “폭력의 알레고리, 놀이·제의로의 양식화”, “미감 회복을 위한 교육연극: 잔혹미를 중심으로”, “21세기 교육연극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학제간 논의” 등이 있다. 《세계일보》, 《부산일보》, 네이버 등에 인문학 칼럼을 연재했다.
차례
포스트휴먼, 포스트드라마
01 다시 쓰는/지우는 연극사
02 창작의 자동화, 알고리즘의 감동
03 인간 없는 연극, 서사 없는 인간
04 대리 체험에서 체험의 시뮬레이션까지
05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극
06 탈진실의 시대, 진실의 연극
07 욕망, 환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연극
08 다시 귀환한 연극이라는 리추얼
09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자기 부정성
10 우리는 연극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책속으로
〈R. U. R.〉에서 인간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들의 욕망이 실현된 순간, 그 욕망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욕망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진보’, ‘더 나은 세계’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항상 ‘지금 여기 있는 너는 충분치 않다’라는 전제를 품고 있다. 진짜 공포는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해야 할 어떤 미래적 조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연극은 언제나 미래의 연극일 것이다.
-03_“인간 없는 연극, 서사 없는 인간” 중에서
라투르(Bruno Latour)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상호 작용하는 ‘행위자의 네트워크(ANT, Actor-Network Theory)’다. 연극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인간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펼칠 때, 그것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무대 조명, 음향 장치, 의상,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 심지어 관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적 사건이다. 연극의 감동은 배우에게서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네트워크적 요소의 결합에서 발생된다. 조명이 바뀌는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울음을 참는 관객의 흐느낌이 새어 나오는 순간 연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배우만이 감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가 감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AI도 포함될 수 있다.
-05_“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극” 중에서
AI는 관객의 선호를 ‘데이터’로 볼 뿐이지만 연극 이후의 연극은 관객의 반응을 ‘사건’으로 본다. 이 ‘이후의 연극’은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호명된 정체성 사이에 틈을 벌린다. AI는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후의 연극은 묻는다−‘너는 누구냐’고. AI는 타자의 욕망을 토대로 욕망을 지시하지만 이후의 연극은 그 지시 체계의 바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욕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킨다.
-07_“욕망, 환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연극”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