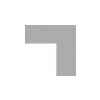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기원전 50년 무렵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묶어 펴냈던 안드로니코스 로도스는 자연을 논하는 일련의 글(physika) 뒤에(meta) 일단의 글을 배치했다. 그러나 그 후속 논고에 붙일 적당한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글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자연학 후속서(ta meta ta physika)’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단순한 문서 분류 표찰에 불과하던 그 이름이 결과적으로 철학의 중핵에 해당하는 한 분과를 지칭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그것을 ‘지혜(sophia)’ 또는 ‘제일철학(prōtē philosophia)’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철학’에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문서 분류라는 순전히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칸트는 그의 형이상학 강의에서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은 “그 학문 자체와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개별 과학과 다르다. 그가 볼 때 형이상학은 두 가지 면에서 개별 과학을 능가한다. 첫째로, 형이상학이 다루는 대상은 맨 나중 것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다. 둘째로, 형이상학적 앎은 가장 참된 앎이고 가장 확실한 앎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앎이다.
형이상학을 규정하는 것은 근원에 대한 천착과, 더 이상 소급해 올라갈 수 없는 제일가는 근거에 대한 탐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가는 원인의 탐구를 두 갈래로 세분해서 진행한다. 하나는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의 원리를 탐구하는 길이다. 이 길은 나중에 ‘존재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다른 한 길은 최고의 존재자,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고 신적인 존재자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탐구다. 이 길은 ‘신학’으로 연결된다. 이 책은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일반적인’ 대답이 될 만한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200자평
서양 철학의 정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를 명쾌하게 번역했다. 존재론과 신학 두 분야 중에서 특히 존재론으로서의 부분을 집중해 다룬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소개해 누구라도 쉽게 일반 형이상학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 철학의 기초는 형이상학. 21세기 오늘날에도 세계의 명품 고전으로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은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BC 367년, 17세 때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로 건너와 플라톤 문하에 들어간다. 20년 동안, 이른바 ‘제1차 아테네 체류 시기’에 그는 오늘날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제들을 익혀 나갔다.
BC 347년 플라톤이 세상을 뜨자 플라톤의 조카이자 상속인이었던 스페우시포스가 아카데미의 수장이 된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37세의 나이로 아테네를 떠난다. 이후 12년 동안의 ‘편력 시기’를 그는 아카데미에서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지냈다. 그가 맨 처음 찾아갔던 사람은 소아시아 아소스의 군주였던 헤르미아스였다. 그의 환대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BC 345년 헤르미아스가 죽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스보스섬의 미틸레네로 옮겨 간다. 2년 뒤 그는 필리포스 왕의 부름을 받아 당시 13세이던 알렉산드로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아테네의 저항운동이 테베의 함락(BC 335년)으로 무산된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야 학창 시절의 아테네로 돌아온다. 그의 ‘제2차 아테네 체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 12년 동안 리케이온에서 일한다.
BC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아테네를 떠난다. 그는 일찍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독배를 들게 만들었던, 신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 두 번씩이나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넌지시 내비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머니의 고택이 있는 에우보이아섬의 칼키스로 낙향한다. 그 얼마 후, BC 322년 10월 이름 모를 병을 앓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내 피티아스 옆에 안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옮긴이
한석환
한석환
한석환은 숭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다. 주된 연구분야는 서양고대철학, 존재론, 수사학이다. 주요 저서로는 《존재와 언어》(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감정의 귀환》(202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이 있으며, 주요 역서로는 《하일라스와 필로누스가 나눈 세 편의 대화》(G. 버클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J. L. 아크릴), 《철학자 플라톤》(M. 보르트) 등이 있다.
차례
제1권
제2권
제4권
제6권
제7권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1.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원리와 원인이다. ‘존재하는 것’인 한에서의 ‘존재하는 것’의 원리와 원인 말이다. (…) 일반적으로 추론에 기초해 있거나 추론과 무관치 않은 모든 학문은, 보다 엄밀한 의미의 원인과 원리든 보다 단순한 의미의 원인과 원리든, 원인과 원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2.
본질, 즉 실체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데아를 상정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근사하게 언급한 경우다(그들은 이데아를 감각적 사물의 질료라거나 ‘하나’를 이데아의 질료라고 상정하지도 않고, 운동의 발단이 그로부터 출발한다고 상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그들은 오히려 [이데아와 ‘하나’를] 부동성과 고요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물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이데아이고 이데아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다).
3.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니와, 그것을 우리는 앞서 여러 가지 의미들의 가짓수에 관한 논의에서 구별한 바 있다. ‘존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임’과 ‘이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이나 분량, 또는 그런 식으로 술어가 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이처럼 일정한 수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가는 [의미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임’이고, 이것은 실체를 의미한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