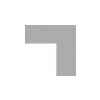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언어의 고유성과 기계의 패턴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다루는 시대, 언어는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 책은 자연어의 본질적 특징인 변주성, 맥락성, 유연성을 중심으로 AI와 언어의 경계를 탐구한다. 인간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정체성, 관계를 반영하는 역동적 규칙 체계다. 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은 빈도·패턴 기반의 예측으로 언어를 처리하며, 이해와 모방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저자는 자연어의 층위—맥락, 창조성, 변이성, 규범성, 언어적 불평등—을 따라 AI가 언어를 해석·왜곡·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신조어, 코드 스위칭, 말실수, 개인어, 법 언어 등 실제 언어 현상을 통해 맥락 처리의 한계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언어적 불평등 문제와 기술적·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진단한다. 언어학·AI·NLP를 잇는 이 책은 언어의 다양성과 기계적 패턴의 충돌을 균형 있게 조망한다.
200자평
AI는 자연어를 정교하게 처리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 책은 언어의 맥락성과 변주성을 통해 AI 언어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고, 신조어·개인어·언어 불평등 등 구체적 사례로 인간 언어와 기계 패턴의 경계를 탐구한다.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황순희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다. 프랑스 파리 8대학 언어과학(박사), 프랑스 루앙대학교 외국어교수법(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학사)를 졸업했다. 귀국 후 부산대학교 U-Port IT 산학공동사업단+정보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 후 연수연구원으로 연구했다. 2025년 현재, 한국공학교육학회 학술지 《공학교육연구》 편집위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교양기초교육컨설팅 컨설턴트, 다수의 해외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Behavioral Sciences 등)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공학교육학회 이병기우수논문상(2023, 2017)과 수차례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어 의미론 연구를 시작으로 자연어 처리, 언어 장애, 언어 습득 관련 다수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공학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으로 연구 지평을 확대해왔다. “Scoping review of studies on affective–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engineering students”(2025), “Unpacking the impact of writing feedback perception on self-regulated writing ability”(2025), “Differences i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s among STEM undergraduates in South Korea”(2024)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SCI(E), SSCI, SCOPUS, KCI 급 학술지에 발표했고, 《AI와 자연 언어》(2025) 등 다수의 저역서를 출간했다.
차례
AI와 자연어의 경계: 변주의 언어, 패턴의 기계
01 맥락 이해와 AI
02 언어 사용역과 AI
03 신조어와 AI
04 코드 스위칭과 AI
05 말실수와 AI
06 개인어와 AI
07 법 언어와 AI
08 자기조절 글쓰기와 AI
09 목적 지향 말하기와 AI
10 언어적 불평등과 AI
책속으로
이러한 학습을 통해 AI는 문장 간 통계적 연관성의 한계를 넘어서, 사물의 형상·소리·동작 등 실세계와 연결된 경험 기반의 의미 구성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가령 “컵을 들었다”가 실제로 어떤 동작과 사물을 뜻하는지를 시각·동작 정보와 함께 학습함으로써, AI의 언어 해석이 보다 실제적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
-01_“맥락 이해와 AI” 중에서
‘킹받다’, ‘스불재’, ‘갓생’과 같은 표현은 기존 어휘 체계 ‘밖’에서 생성된 새로운 언어다. 신조어는 문화, 세대 감각, 정체성 등이 집약된 언어적 실험이며, 종종 은어나 은유의 경계에서 탄생한다. AI 언어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없는 이러한 어휘나 표현, 급변하는 의미 변화 처리에 취약하다. AI는 문맥과 통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신조어를 처리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AI에게 신조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종종 해독 불가능한 문화 코드로 남기도 한다.
-03_“신조어와 AI” 중에서
AI의 실언, 중복 발화, 단어 선택 오류 등은 인간 말실수와 유사하게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말실수가 인지적 병목, 계획 충돌, 발화 모니터링 실패 등 심리언어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면 AI의 오류는 전적으로 확률 기반 예측 실패, 훈련 데이터 편향, 문맥 추론 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05_“말실수와 AI” 중에서
둘째, 한국어 법령은 높은 전문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상어와는 다른 어휘 체계를 사용한다. 가령 ‘기망’, ‘위법’, ‘소멸시효’ 등 한자어 중심 용어와 ‘∼하여야 한다’, ‘∼아니 한다’ 등과 같은 문어적·고어적 표현이 빈번히 사용된다. 이러한 형식성과 규범성은 법 언어의 정체성을 강화하지만, 현대적 언어 감각과는 괴리가 있다.
-07_“법 언어와 AI”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