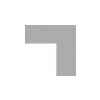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트랜스휴먼 시대의 윤리적 고찰
1970년대 앨빈 토플러는 3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고하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 혁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룬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인공지능은 1960년대 MIT의 존 매카시가 처음 개념화한 후, 영화와 문학을 통해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발전해왔다. 영화 속 인공지능 캐릭터들은 인간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상을 띠며, 인간의 신체와 마음이 기계와 결합하는 미래를 보여준다.
특히, 영화 <업그레이드>(2018)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체와 결합하면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며, 인공지능의 윤리성과 통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그녀>(2014)와 <엑스 마키나>(2014) 같은 작품은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겪는 모순과 갈등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인공지능의 진화와 함께,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트랜스휴먼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개념을 재정의할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21세기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영화와 문학을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며,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0자평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확장하는 시대를 예고한다. 영화와 문학은 인공지능이 인간성과 결합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변화하고, 윤리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며, 미래에는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은이
장미화
21세기 영상 문화, 영화의 포스트시네마로서 매체적 진화에 대해 연구해 왔다.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영화에 대한 사고를 진작하는 강의, 인문콘텐츠학, 문화 산업과 스토리텔링, 동서양 복식, 음식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상 예술학 박사 학위를, 파리1대학 조형예술 과학 대학원에서 영화의 시간성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히치콕에게 묻고 싶은 것들』(2013), 『디지털 영화와 들뢰즈의 시간-이미지』(2019), 『앨프레드 히치콕의 서스펜스 테크닉』(2021), 『미디어 격차』(2021), 『포스트시네마가 사유하는 인공지능』(2024)이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블랙 스완> 몰핑 기술을 통해 본 포스트시네마의 신경 이미지적 특성”(2021)을 포함해 여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차례
인류의 동반자이자 적, 인공지능
01 인공지능의 정체성: <트랜센던스>
02 인공지능의 역습과 인간의 재설계: <나의 마더>
03 인공지능 활용의 위험 요소 고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04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자율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메간>
05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해: <매트릭스>
06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와 윤리성 부여 방안: <업그레이드>
07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설계: <아이, 로봇>
08 인공지능의 감정과 그 양가성: <엑스 마키나>
09 인공지능의 진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녀>
10 인공지능의 정체성: <채피>
책속으로
<트랜센던스>에서 과학자 윌은 기술 개발에 반대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다. 이후 그의 뇌 속의 기억이 컴퓨터 프로그램 핀(PINN)으로 업로드되어 초지능에 해당하는 트랜센던스가 구현된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능보다 너무 앞서 나간 초지능의 출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오히려 초인간적인 인공지능의 출현에 극도로 공포심을 드러낸다.
-01_“인공지능의 정체성: <트랜센던스>” 중에서
미래에 인간은 인공지능 컴퓨터와 먼 우주로 탐험을 떠난다. 인류 문명의 비밀을 찾는 보우먼은 디스커버리호를 관장하는 컴퓨터 인공지능 할의 역습을 받는다. 할은 보우먼에게 자신의 오류를 숨기려고 살해를 시도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오디세우스 신화를 상기시키면서 인류가 문명의 도약을 거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승리한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인류가 넘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며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난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03_“인공지능 활용의 위험 요소 고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장 보드리야르는 근대 이후의 소비 사회를 시뮬라크르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원본 없는 시뮬라크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세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네오는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현실 속 안락한 삶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표상한다.
-05_“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해: <매트릭스>” 중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에는 인간의 힘든 노동을 대신해 주고 나아가 인간의 고독함, 외로움 등의 감정적인 면까지도 보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에서 음성 기반 인공지능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진화가 장차 어떤 특성을 나타낼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09_“인공지능의 진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녀>”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