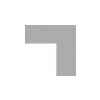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AI가 바꾸는 문화예술,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심층 분석한다. 창작 도구에서 독립적 창작 주체로 진화한 AI는 예술의 정의와 경계를 재구성하며, 창작·유통·향유 전반을 혁신하고 있다. 동시에 저작권, 윤리, 문화 다양성 등의 문제도 함께 살펴본다.
이 책은 AI 예술의 발전 과정을 살피고,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문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통찰과 전략을 담았다.
200자평
인공지능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저작권·문화 다양성 문제를 분석한다.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정책적 해법을 제시한다.
지은이
양현미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에서 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문화 정책을 연구했으며(1994∼2009), 이후 서울특별시 문화기획관(2014∼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2017∼2019),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2019∼2021) 등을 역임하며 문화 정책 실무에도 참여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 이론, 역사, 실천』(공저, 2024), 『현대문명의 위기』(공저, 2014), 『미학과 그 외연』(공저, 2010) 등이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 관점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 연구”(2023),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2023) 등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23), 『신흥 선도국의 문화교류 전략』(2022) 등 다양한 문화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문화 정책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사람이 있는 문화』(2020), 『창의한국』(2005),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 등을 수립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박물관학회 등의 이사를 역임했다.
차례
AI와 문화예술 생태계
01 AI와 예술 창작
02 AI와 문화 콘텐츠 제작
03 AI와 문화 시설
04 AI와 문화 플랫폼
05 AI와 문화 향유
06 AI와 문화 노동
07 AI와 저작권
08 AI와 윤리
09 AI와 예술인 양성
10 글로벌 문화 정책, 동향과 제언
책속으로
AI가 창작 도구로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대에 예술의 독창성은 기술적 구현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탐구하며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스타일을 모방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창작을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능력은 부족하다. 예술가의 역할은 AI에게 지시하고 AI가 제공하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창작 의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큐레이션하는 것이다. AI가 소설을 수백 편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지만, 언제 생성을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창작자의 몫이다.
-01_“AI와 예술 창작” 중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은 AI를 활용해 수백만 건의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를 분류하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해 자료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로봇은 장서 점검, 자료 이송, 서가 정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AI 로봇을 도입해 장서 점검을 자동화해 직원들이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기반의 자동화 서고 시스템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자료 접근성을 높인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헌트 도서관 북봇(Hunt Library BookBot)>은 기존 서가 대비 9분의 1 정도의 공간에 장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책을 신청하면 로봇이 찾아 준다. 이는 장서 관리 공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03_“AI와 문화 시설” 중에서
하지만 문화 노동의 새로운 창조적 불안정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첫째, 창작 과정의 자동화로 노동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던 직무군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역량에 따라 일자리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예술인의 저작권이 위협받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배우의 목소리와 외모 등을 학습해 창작자의 정체성을 문화 노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와 성우들은 이에 따라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수익원을 갖게 되었지만, 분리된 정체성을 기업이 갖거나 도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챗GPT-4o의 목소리가 영화 <그녀(Her)>에 나온 스칼렛 조핸슨의 목소리와 비슷해서 문제가 된 사건을 일례로 들 수 있다.
-06_“AI와 문화 노동” 중에서
재직자 훈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 사업>(2021∼2022)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듀코카에서 , ,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 방송 및 콘텐츠>, , <사운드에 AI 적용하기> 등 AI 이해와 활용 주제로 약 2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AI 융합 예술 교육은 고등 교육에서 대학 특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직자 훈련에서는 아직 비중이 낮은 편이며 체계적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09_“AI와 예술인 양성”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