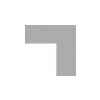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고립의 시대와 AI: 현대 사회에서의 연결과 고립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기계처럼 반복되는 노동은 고립과 소외를 상징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공장 노동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는 점차 개인화와 고립을 심화시켰다. 현대 사회에서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가족 간의 연결 부족,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결여로 나타난다. 팬데믹 이후 고립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도 이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개인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만들었다.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청년들은 ‘생존주의’에 갇히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된다. 이는 고립된 상태로 이어지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고립을 극복할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생성형 AI는 고립된 개인들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존재한다. 고립된 사람들은 AI를 통해 계속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고립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상상할 것인가이다. AI는 우리가 연결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부정적인 고립을 더욱 강화할지,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200자평
영화 <모던 타임즈>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기계처럼 노동하며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모습을 그린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쳤지만, 물질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경쟁과 고립이 심화되었다. AI는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대 가능성도 제시한다. 현대인은 고립의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며 AI를 통해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은이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정책을 연구하려고 행복경제학을 공부했다. 2021년 하반기에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뿐 아니라 전 생애에서 고립된 이들이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집필한 주요 정책보고서로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2021,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20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2022),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2023),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고립, 그 양상과 결과”(2024) 등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2024년 9월에는 청년의 고립과 은둔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청년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차례
고립, 그리고 AI와 열 수도 있는 새로운 연대
01 우연한 만남, 고립과 AI
02 사람을 만나는 방법
03 비교와 실패
04 무사고와 무지성
05 행복과 쾌락
06 발견
07 관계 연습
08 관계 확장
09 초월적 관계
10 새로운 연대를 여는 AI
책속으로
알고리즘을 따라 SNS 피드에 뜨는 호캉스나 명품의 장면을 습관적으로 로그인한 내 피드에서 마주하면 내 일상의 가치를 절하하고, 되려 실패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누군가가 일시적인 순간을 연출한 사진을 고르고 골라 업로드한 것이라고들 한다. 사진을 찍은 자에게도, 우연히 그 사진을 보는 이에게도 진실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정답의 삶인 것처럼 유유히 떠다닌다.
-03_“비교와 실패” 중에서
2000년 전 그리스에서 유래한 쾌락주의는 고통을 회피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심신의 평화와 자족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타인과의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시공간에서 비인간적 존재인 AI로부터 즉시 주어지는 자극에 중독되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쾌락은 인간성을 말살하기도 한다.
-05_“행복과 쾌락” 중에서
고립된 이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말 그대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숨어 있는 이들을 탐지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다. 고립된 이들이 현재 상태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순간을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고립되어 24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건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06_“발견” 중에서
SNS는 시공간을 초월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했다. 국경과 시간대까지도 넘나든다. 학습된 AI는 마치 영화에서처럼 동시에 다수의 개인화된 접촉을 실현하기도 한다. 놓쳤던 혹은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칠 수 있었던 인맥을 찾아주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있다. 상상해 왔던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AI 시대에 현실이 될 수 있다.
-09_“초월적 관계”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