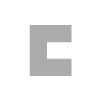방죽가에서 느릿느릿
秋日抒情 8
텅 빈 충만
이제 비울 것 다 비우고, 저 둔덕에
아직 꺾이지 못한 억새꽃만
하얗게 꽃사래치는 들판에 서면
웬일인지 눈시울은 자꾸만 젖는 것이다
지푸라기 덮인 논, 그 위에 내리는
늦가을 햇살은 한량없이 따사롭고
발걸음 저벅일 때마다 곧잘 마주치는
들국 떨기는 거기 그렇게 눈 시리게 피어
이 땅이 흘린 땀의 정갈함을
자꾸만 되뇌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간간 목덜미를 선득거리게 하는 바람과
그 바람에 스적이는 마른 풀잎조차
저 갈색으로 무너지는 산들 더불어
내 마음 순하게 순하게 다스리고
이 고요의 은은함 속에서 무엇인가로
나를, 내 가슴을 그만 벅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청함을 딛고 정정함에 이른
물빛 하늘조차도 한순간에 그윽해져서는
지난여름 이 들판에서 벌어진
절망과 탄식과 아우성을 잠재우고
내 무슨 그리움 하나 고이 쓸게 하는 것이다
텅 빈 충만이랄까 뭐랄까, 그것이 그리하여
우리 생의 깊은 것들 높은 것들
생의 아득한 것들 잔잔한 것들
융융히 살아오게 하는 늦가을 들판엔
이제 때 만난 갈대만이 흰 머리털 날리며
나를 더는 갈 데 없이 만들어 버리고
저기 겨울새 표표히 날아오는 들 끝으로
이윽고 허심의 고개나 들게 하는 것이다
≪방죽가에서 느릿느릿≫, 고재종 시인의 육필시집
고재종(1957~ )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흙과 더불어 살았다. 1984년 시인의 칭호를 얻은 뒤에도 10여 년을 직접 논밭을 일구며 자연과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편에 담았다. 땀 흘린 만큼 시를 지었고, 이제 농사일은 떠났지만 늦가을 들판처럼 비웠기에 충만하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