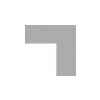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복수의 칼을 든 자매, 효녀인가 패륜인가?
조선을 뒤흔들었던 박효랑의 파묘 사건을 소설로 다시 읽는다
18세기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던 죽산 박씨 가문의 산송 사건을 소재로 한 전(傳) 작품을 한곳에 모았다. 이른바 ‘박효랑 사건’은 박문랑(朴文娘) 집안의 선산에 한 세력가가 자기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이장해 온 데에서 비롯한다. 선산을 부당하게 빼앗긴 문랑의 아버지는 곧장 관청에 호소했지만 권세가와의 소송은 무력한 패배로 끝이 난다. 이 과정에서 문랑의 아버지가 판결을 담당하던 관찰사의 불공정을 의심해 내지른 말이 괘씸죄가 되는 바람에 곤장을 맞고 사망한다. 이에 큰딸이 선산으로 뛰어가 상대 집안의 묘를 파헤쳐 도발하고는 결국 그들의 칼에 죽는다. 아버지와 형제를 원통하게 잃은 남은 자식들이 뒤이어 분투하지만 끝내 사건의 시비를 명백하게 가리지 못했으며, 십수 년 이후에 문랑이 정려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수십 년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효랑 사건은 그와 관련된 여러 기록이 저마다 곡진한 이야기의 형태로 전하며 널리 읽혔다. 이 책에는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임상정의 〈박효랑전〉, 남유용의 〈효자박씨전〉, 안석경의 〈박효랑전〉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판관 이의현이 남긴 회고록 〈도협총설〉을 수록했다. 네 명의 기록자가 남긴 글을 통해 같은 사건이 기록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기억되는지 추적한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로서의 생명력을 얻은 이들 작품은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마치 하나의 역사 스릴러를 읽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 〈파묘(破墓)〉(2024)는 ‘묘를 파헤치다’라는 제목부터 이미 묏자리 명당에 관련한 작품임을 선언한다. 걸출한 재벌가일수록 대대로 명당에 집착해 왔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예상보다도 더욱 전면적으로 음양오행이나 풍수지리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요소라 할 것들을 반복해 다룬다. 그럼에도 한국 영화사상 기념비적 흥행 기록을 수립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일이다. 21세기 대중이 묏자리를 통해 좌우되는 운명론적 서사에 이토록 열렬하게 반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조선 문인들의 손끝에서 변주되는 박효랑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200자평
18세기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던 죽산 박씨 가문의 산송 사건, 이른바 ‘박효랑 사건’을 다룬 전(傳)을 한곳에 모았다. 부당한 권력에 의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에 항거하는 자매들의 복수 이야기는 저마다 곡진한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어 널리 읽혔는데, 이 책에는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임상정의 〈박효랑전〉, 남유용의 〈효자박씨전〉, 안석경의 〈박효랑전〉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판관 이의현이 남긴 회고록 〈도협총설〉을 수록했다. 네 명의 문인에 의한 네 개의 기록, 《박효랑 이야기, 복수하는 자매들》은 기록자의 시선에 따라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지 보여 준다.
지은이
임상정(林象鼎, 1681∼1755)
나주(羅州) 임씨 가문으로 자는 덕중(德重)이다. 나주 임씨 가문은 고려조에 현달한 인물들을 배출했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는 숙종 무렵까지 큰 벼슬에 이른 인물은 많지 않다. 임상정도 1699년(숙종 25)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끝내 문과 급제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가 40대에 남겨 둔 기록에 따르면 “나는 평소 변려문(騈儷文)을 잘하지 못해서 20년간 누차 과거에 낙방한 끝에 이제는 머리가 듬성듬성해지려 한다”는 자기 고백이 있다. 이로 보아 임상정은 19세에 진사시 합격 이후 40대가 될 때까지도 문과에 도전을 이어 갔던 것 같다. 그럼에도 결국 긴 세월을 주로 지방 수령직에 머물러야 했다. 다만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문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도 문학적 저술에 심취한 삶을 살았으며 임종을 맞은 75세까지도 왕성한 저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삶의 태도 등을 피력해 두고자 했다.
‘절로 즐거이 쓰다’는 표제를 내걸고 엮어 낸 문집 《자오록(自娛錄)》을 통해 임상정이 일생 동안 견지했던 삶의 태도와 문학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집의 원본은 현재 문중에서 관리 중이나 그 사본(寫本)이 임형택(林熒澤) 교수의 기증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자오록》의 선집(選集) 《자오록초(自娛錄抄)》는 그 필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남유용(南有容, 1698∼1773)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뇌연(雷淵)이다. 숙종조 대제학을 지낸 남용익(南龍翼)의 증손이며, 순조조 영의정에 올랐던 남공철(南公轍)의 아버지다. 남유용 본인 또한 영조조를 대표하는 관료로 손꼽히며 특히 정조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명망 높은 가문 출신으로 말년에는 대제학까지 지냈지만 출세에 집착하지 않아 벼슬을 사직하는 일이 잦았고 다만 문주(文酒)를 즐기며 자족했던 인물이다. 33세 무렵 자신의 거처를 ‘삼일당(三一堂)’이라 이름 짓고 책과 술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지내고자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76세까지 살았으며 그가 죽은 후 《영조실록》에 “사람됨이 탄이(坦夷, 시름없이 진정되고 평탄함)하고 순실(純實, 순수하고 참됨)해 세상일에 담연(淡然, 욕심 없고 깨끗함)했다”는 인물평이 보인다.
한시(漢詩)에 능해서 전하는 작품이 2천여 편에 달하는데 시를 포함한 그의 방대한 저작은 《뇌연집(雷淵集)》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문집은 남유용 사후 10년이 되던 1782년에 정조의 명으로 간행된 것이며 정조가 서문을 썼다. 어린 시절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더불어 당시 순정한 고문을 장려하려는 문체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이라 풀이된다. 1784년 유만주(兪晩柱)라는 한 장서가(藏書家)의 일기에 이른바 ‘조신선(曺神仙)’이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책 장사꾼 조씨와의 거래 내용이 전하는데, 당시 《뇌연집》은 30권 15책이라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단돈 두 냥으로 값이 매겨졌다고 한다. 이에 유만주가 “일생 동안 힘을 다해 문장을 성취했지만 결국 두 냥어치로 귀결되다니, 문장은 해서 무엇 하나”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뇌연집》의 현 소장처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안석경(安錫儆, 1718∼1774)
본관은 순흥(順興), 호는 삽교(霅橋)다. 아버지 안중관(安重觀)은 당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창흡[金昌翕,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의 문인으로 노론계 학자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와 교분을 맺은 김창흡 등을 통해 학문을 익힌 안석경은 20대에는 아버지의 임소(任所)를 따라 생활하며 과거에 응시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던 해에 마지막으로 응시했던 과거에 낙방하고 그때부터는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즉, 30대 중반 이후 안석경은 강원도 두메산골 횡성 삽교리(霅橋里)에 파묻혀 제 나름의 저술에 매진하며 살았다. 그 결과 《삽교집(霅橋集)》과 《삽교만록(霅橋漫錄)》이라는 저서를 남겼고 이러한 그의 행보는 18세기 노론계 처사형 인물이라는 말로 갈음되어 왔다.
안석경이 남긴 글에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주류에서 비켜선 방외인으로서의 분방함이 모두 짙게 배어들었다. 소설적 흥미를 넉넉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의한 세태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이 엿보이는 〈박효랑전〉과 〈검녀〉를 통해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매서운 경세가(經世家)로서의 면모를 선명하게 인식해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저서 《삽교만록》이 야담계 한문소설을 다수 수록한 필기류 문집인 점도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박효랑전〉이 수록된 《삽교집(霅橋集)》은 규장각 도서에 7권 4책이, 〈검녀〉[원제는 무제(無題)]가 수록된 《삽교만록(霅橋漫錄)》은 일본의 동양문고에 6권 5책의 형태로 각각 소장 중이다.
이의현(李宜顯, 1669∼1745)
본관은 용인(龍仁), 호는 도곡(陶谷)이다. 아버지 이세백(李世白)은 좌의정을 지냈으며, 본인도 형조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했던 명재상이다. 숙종조부터 영조조까지 활약했던 노론계 인물로서 오랜 노소 대립과 갈등 속에서 파직, 삭직되는 등 몇 차례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쉽게 복직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때도 있었으나 생애 전반을 놓고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용·천거·임명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겠다. 이에 말년에는 노론의 영수로 추대되어 노론 정권 사상 최대의 참변이라 꼽히는 신임옥사(辛壬獄事)의 희생자들, 즉 노론 4대신(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을 비롯한 수많은 노론계 인사들의 신원 및 복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학문과 문예에 큰 관심을 두어 문장으로도 이름이 있었으며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의 수천 권 장서가로 유명하다.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하려는 벽(癖)이 있을 정도로 자료 수집 및 저술에도 몰두했던 면모가 있다. 청나라에 다녀와 쓴 연행기, 40세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남긴 유람기가 제법 알려져 있으며 저서 《도곡집(陶谷集)》 32권이 있다.
옮긴이
임이랑(任이랑)은 조선 후기 인물전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도교수의 안내로 2017년에 박효랑 자료를 처음 접했고 이후 수년간 효자·효녀 및 열녀를 다룬 인물전 2백여 편을 강독했다. 해당 강독 자료를 토대로 〈조선 후기 ‘박효랑(朴孝娘) 서사’의 변전 양상과 의미〉, 〈‘호랑이가 도운 효부(孝婦)’의 서사적 교섭 양상〉, 〈조선 후기 여성 ‘효(孝)·열(烈) 서사’ 연구〉 등의 논문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 몇 가지 후속 연구를 덧붙여 다듬은 대중교양서 《내 이름을 찾아주오》(2024)를 발행했으며, 대중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박효랑 자료의 원문 및 번역문 전문, 작품별 상세 해설은 이 책을 통해 따로 소개하게 되었다. 한국교원대, 전북대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다.
차례
옮긴이 서문
박효랑전(朴孝娘傳) / 임상정
효자박씨전(孝子朴氏傳) / 남유용
박효랑전(朴孝娘傳) / 안석경
도협총설(陶峽叢說) / 이의현
원문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문랑이 흐느끼며 노비들에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니 기꺼이 나를 따르겠느냐?”
하니 모두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대답했다.
이에 집안의 호미와 쟁기 등의 농기구를 모두 모아서 노비들에게 주어 무기로 삼았다. 문랑이 큰 도끼를 쥐고 하늘을 향해 한 번 크게 소리치고 나서자 노비들이 모두 뒤따르며 누구 하나 뒤처지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산으로 달려가 박 현감 아버지의 무덤을 내리찍어 댔다. 무기가 부러지면 맨손으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파냈다. 문랑을 따라온 노비들이 모두 그 관을 쪼개고 시신을 들어내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니, 묘지기가 두려워하며 감히 다퉈 보지도 못하고 뛰쳐 가 박 현감에게 알렸다.
– 남유용, 〈효자박씨전〉_28쪽 중에서
관찰사가 성산수령과 나란히 앉아 관을 열어 보니 옷과 치마는 이미 썩어서 검었다. 그러나 비위를 상하게 할 만한 냄새는 그다지 어지럽지 않았다. 신체와 얼굴이 적잖이 변했음에도 피가 난 상처가 붉었고 다섯 군데의 흔적이 과연 분명했다. 관찰사가 기이함에 탄식하더니 마침내 옥안을 바로잡아 상소를 올렸다.
그럼에도 경여가 끝내 처벌되지 않자, 세 남도와 경기도의 유생 7천여 명이 상소(上疏)로 청하기를, 박씨를 정려하고 경여의 죄를 바로잡아 달라 했다. 임금께서 해당 관청에 자세히 처리하라 명해 효랑은 정려되었으나 경여는 끝내 처벌되지 않았다.
– 안석경, 〈박효랑전〉_42쪽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