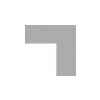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삼방록(三芳錄)》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자와 필사 연대를 알 수 없는 한문 단편소설집이다. “세 편의 꽃다운 이야기”라는 뜻의 “삼방록(三芳錄)”은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왕경룡전〉, 〈유영전〉, 〈상사동기〉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붙인 제목이다. 표지에는 “삼방요로기(三芳要路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세 편의 애정소설에 〈요로원야화기〉로 잘 알려진 풍자소설 〈요로원기(要路院記)〉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결과다.
〈왕경룡전〉은 명나라 풍몽룡의 화본소설 《경세통언》에 실린 〈옥당춘낙난봉부(玉堂春落難逢夫)〉를 번안한 작품이다. 번안 과정에서 원전에 없는 시가 다수 추가되었고,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재편되는 등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형태로 바뀌었다.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욕망이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반복되는 이별로 남녀 주인공의 결합이 지연되기 때문에 여타 전기소설에 비해 많은 분량이 특징이다. 작품 제목에는 ‘왕경룡’이라는 남주인공을 내세웠지만,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방해하는 ‘기생 어미’에 대해 여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성 중심의 작품이다. 20세기 이 작품을 활자화한 《벽부용(碧芙蓉)》(회동서관, 1912)과 《청루지열녀(靑樓之烈女)》(신구서림, 1917)도 모두 여성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유영전〉은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과 젊은 선비 김 진사가 금지된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발각되어 둘 다 자결하고 만다는 비극적 애정소설이다. ‘운영전’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작품으로,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어로 번역되고 활자본으로 간행되기도 했으며, 영화로 상영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수성궁’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궁녀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궁녀를 화자로 내세운 설정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고전소설에서 여성 화자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특별한 개성이라 할 만한다. 안평대군의 다층적인 성격도 주목된다. 궁녀들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는 중세적 이념과 억압을 체현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남녀의 재능을 차별하지 않는 진보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상사동기〉는 ‘영영전’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다. 〈유영전〉과 유사하게 궁녀와 젊은 유생의 금지된 사랑을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물과 상황에서 기존의 설정을 뒤틀어 기존의 문학적 관습에 반론을 제기한 작품이다. 〈유영전〉의 이원적 세계관, 즉 세계를 ‘천상’과 ‘지상’으로 양분하는 인식을 탈피해 지상의 현실만을 다룬다. 〈유영전〉의 지상, 즉 현실 세계에서는 남녀의 결합이 파탄 난 것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그들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상사동기〉는 보다 일반적인 삶에 밀착된 방식으로 현실을 형상화하는 ‘현실성의 미학’을 갖춘 작품이라 평가된다.
〈요로원기〉는 박두세(朴斗世, 1650∼1733)가 저술한 작품으로 〈요로원야화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의 세 작품이 애정소설인 것과 달리 이 작품은 필기류 풍자소설에 해당한다. ‘요로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극적으로 구성했다. 우연히 만난 시골 선비와 서울 선비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의 갈등과 당대의 사회 문제를 흥미롭게 드러낸다. 빈부, 신분, 혼인, 지식, 지역, 과거, 붕당 등 다양한 화제를 넘나드는 지적인 소설이다.
200자평
필사자와 필사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한문 단편소설집이다. “세 편의 꽃다운 이야기”라는 뜻의 “삼방록(三芳錄)”은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왕경룡전〉, 〈유영전〉, 〈상사동기〉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붙인 제목이다. 표지에는 “삼방요로기(三芳要路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세 편의 애정소설에 〈요로원기(要路院記)〉라는 풍자소설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세 편의 꽃다운 이야기와 한 편의 날카로운 풍자, 《삼방록(三芳錄)》을 완역해 소개한다.
옮긴이
이대형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다.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에 관한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승려 문집의 문체와 유·불 교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금오신화 연구》, 공저로 《옛편지 낱말사전》, 역서로 《요람》과 《수이전》, 《용재총화》, 《다송문고》 등이 있다.
차례
왕경룡전
유영전
상사동기
부록 : 요로원기
원문
王慶龍傳
柳泳傳
相思洞記
附 : 要路院記
해설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열 사람의 이름은 소옥(小玉), 부용(芙蓉), 비경(飛瓊), 비취(翡翠), 옥녀(玉女), 금련(金蓮), 은섬(銀蟾), 자란(紫鸞), 보련(寶蓮), 운영(雲英)이니 첩이 바로 운영입니다.
대군께서 모두 매우 예뻐하셔서 궁중에 두고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문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문예를 다투시면서도 첩들은 한 번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혹 궁 밖의 사람들이 알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항상 명을 내리시기를,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서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고 궁 밖의 사람들이 궁인 이름을 알아도 그 죄 또한 죽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유영전〉_95∼96쪽 중에서
나는 다시 들어가서 마루 아래로 나아가 옷을 걷고 그 위에 오르는데, 객은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침구를 펴 놓은 채 그 위에서 팔베개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 밖의 남은 공간이 여러 명이 앉을 만했다. 나는 마루에 올라가 서서 인사를 나누고자 했으나 객은 여전히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자는 서울 양반이라서 의관이 말쑥하고 화려하며 안장과 말이 호사스럽고 건장한데, 내가 시골 양반이라서 예의를 차리지 않는구나. 저놈의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기운을 술책으로 꺾어야겠다.’
그리고 곧 매우 공손하게 절을 했지만 객은 베개를 베고 머리만 끄덕이면서 천천히 말했다.
“존객(尊客)께서는 어디 사시오?”
– 〈요로원기〉_217∼218쪽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