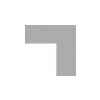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AI는 생각하는가, 우리는 의식을 아는가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려는 오랜 질문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다시 묻는다. 철학과 과학, 신경생물학과 AI 이론을 넘나들며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정면으로 다룬다. 식물인간의 사례부터 사이버네틱스, 네이글의 ‘박쥐 논의’, 다마지오의 감각이론까지 풍부한 사례와 이론을 통해 독자를 사유의 여정으로 이끈다.
이 책은 AI와 의식 연구의 교차점을 조망하며,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기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인간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의식의 본질을 다시 사유하도록 이끈다. 의식을 연구하는 철학자, 과학자, 기술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
200자평
인간의 자각과 기계의 지능이 만나는 지점에서 의식의 본질을 탐구한다. 철학과 과학, 기술이 얽힌 이 복잡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깊은 사유로 이끈다.
지은이
한정규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서울대학교에서 뇌인지과학을 공부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우울증 · 조울증 ·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 질환을 통해 인지 · 감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신경과학과 철학 사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체화인지학회, 한국과학철학회, 뇌신경철학연구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차례
나를 알아 가는 문제
01 의식 문제의 중요성
02 대중매체에 등장한 의식 문제
03 대중화된 의식 과학 연구
04 의식 문제와 정의
05 철학 문제로서의 의식
06 과학 문제로서의 의식
07 의식 과학에 대한 주요 이론
08 비인간 모델과 의식
09 특이한 의식
10 인공지능, 의식, 그리고 미래
책속으로
금기를 깨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아닐까? 학문의 역사에서 이전 세대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뒤집어버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인지주의 심리학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학계를 지배했던 행동주의 심리학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집중하며, 자극과 반응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인지주의 심리학은 학습에 필수적인 기억과 같은 인지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고,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자극과 반응에 주목했다. 다만, 행동주의자들이 정신 과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신 과정이 특정 행동과 반드시 연관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인지주의자들은 당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인 ‘정보’를 활용해 기존 패러다임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를 통해 인지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두 번째 예로, 새로운 프레임이 학문의 판도를 바꾼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David Chalmers)가 제안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프레임이다.
-01_“의식 문제의 중요성” 중에서
물론, 현대 신경과학의 첨단 기술 중 하나인 광유전학(optogenetics)은 기억의 주입, 저장, 인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이 기술은 유전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세포를 선택하고, 선택된 세포만을 빛으로 자극해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행동과 관련된 기억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오래된 기억이나 복합적인 기억의 주입·저장·인출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뇌가 최소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수는 그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03_“대중화된 의식 과학 연구” 중에서
깨어 있는 상태와 잠들어 있는 상태의 차이를 통한 의식 연구는 다양한 신경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행된다. 수면 다원 검사(Polysomnography)는 이러한 연구의 핵심 도구로, 뇌파, 안구 운동(EOG, ElectroOculoGram), 근전도(EMG, ElectroMyoGram),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호흡 등 여러 생체 신호를 동시에 측정한다. 이를 통해 수면의 각 단계(N1, N2, N3, REM)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Default Mode Network) 연구 또한 의식 상태를 탐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휴지기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해 자기 참조적 사고, 과거 회상, 미래 계획 등의 내부 지향적 인지 활동을 지원하지만, 수면 상태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기능적 연결성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06_“과학 문제로서의 의식” 중에서
2007년 의학 저널 ≪란셋(Lancet)≫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44세 남성에게 대뇌 피질 영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2주간 경미한 좌측 다리 약화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며, 이후 여러 신경심리학적 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시행했다. 신경심리학적 검사 결과, 환자의 지능지수(IQ)는 75로 측정되었으며, 언어성 IQ는 84, 동작성 IQ는 70이었다.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측뇌실의 심한 확장이 관찰되었고,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측뇌실, 제3뇌실, 제4뇌실의 현저한 확장과 극도로 얇은 대뇌 피질층, 그리고 후두와 낭종이 확인되었다. 그는 과거 심방 뇌실 단락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그 외 신경학적 발달과 의학적 병력은 정상 범주에 있었다. 특히, 환자는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09_“특이한 의식”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