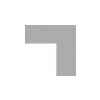책소개
형이상학에 갇힌 현상을 해방하다
사랑과 계시를 아우르는 ‘주어짐의 현상학’
현상학은 세계가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을 분석하며 현상 자체를 철학의 중심에 두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철저성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형이상학의 원리 아래 사고하면서 현상을 대상성이나 존재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장뤽 마리옹은 기존 현상학이 멈춘 지점을 짚고, 그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그 길이란 현상의 주어짐 자체에 천착하는 현상학, 바로 ‘주어짐의 현상학’이다. 주어짐의 현상학은 사랑, 신성, 예술적 경험과 같이 인간의 의식이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현상들까지 아우른다. 이로써 마리옹은 현상학적 사유를 형이상학의 틀에서 해방한다.
이 책은 철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마리옹의 사유를 열 가지 키워드로 해설한다. 마리옹이 데카르트에게서 발견한 회색 존재론, 백색 신학, 존재-신-론과 더불어 종교철학·신학을 혁신한 마리옹의 탈형이상학적 신-담론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증인’, ‘포화된 현상’, ‘계시’ 등 주어짐의 현상학을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 연구를 위시한 형이상학 철학사가, 탈형이상학적 신-담론의 주창자, 자기만의 관점을 벼려 낸 현상학자 마리옹과 함께 세계를 보는 시선을 확장해 보자.
장뤽 마리옹(Jean-Luc Marion, 1946∼ )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와 근대 형이상학에 관한 뛰어난 연구를 남겼다. 레비나스 이후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현상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낭테르대학교와 소르본대학교,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푸아티에대학교, 소르본대학교, 미국 시카고대학교 등에서 가르쳤다. 지금도 보스턴칼리지 가다머석좌교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데카르트에 관한 참신한 연구를 필두로 탈형이상학적 신-담론, 주어짐의 현상학 등 독창적인 자기만의 철학 세계를 구축했다. 이런 업적 덕에 프랑스 학술원 종신회원으로 선출되었고, 가톨릭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라칭거상을 수상했다.
200자평
장뤽 마리옹은 철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현상학적 철학자다. 데카르트를 비롯해 근대 형이상학을 독창적으로 해석했고, 탈형이상학적 신-담론으로 종교철학과 신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 ‘주어짐의 현상학’을 정초해 인간의 의식이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현상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형이상학의 틀에서 해방된 사유가 여기 있다.
지은이
김동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벨기에 루뱅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 종교학, 현상학, 종교철학 등을 연구했다. 레비나스, 앙리, 마리옹 등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현상학을 주로 공부한다. 우리 시대 종교철학의 역할과 의미 역시 깊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2015),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2014, 공저)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마리옹의 ≪과잉에 관하여≫, 레비나스의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리처드 카니의 ≪재신론≫ 등이 있다.
차례
철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현상학적 철학자
01 데카르트와 회색 존재론
02 데카르트와 백색 신학
03 데카르트와 존재-신-론
04 탈형이상학적 신-담론: 존재 없는 신
05 주어짐의 현상학: 세 가지 환원
06 순수한 선물
07 현상의 주름과 증인
08 포화된 현상
09 계시
10 마리옹의 세 가지 면모와 가톨릭적 지향
책속으로
마리옹의 작업은 바로 이 세 가지 차원, 즉 데카르트와 근대 형이상학을 존재-신-론 비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 형이상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신-담론의 고안, 주어짐의 현상학을 통해 현상학의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어짐 현상의 현상성을 오롯이 보여 주려는 시도로 정돈할 수 있다. 이 셋을 가로지르는 요소로는 여럿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탈형이상학적 사유’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마리옹이 점차 ‘현상학자’로 불릴 만큼 현상학에 큰 공을 들인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_“철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현상학적 철학자” 중에서
왜 백색 신학인가? 전통적으로 신은 원인으로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은 근대적 형이상학의 사유 아래서만 논의되는 이성적 신학의 개념적 신으로 전락 또는 재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마리옹은 데카르트의 신학이 흰 도화지의 빈 공백을 전부 채울 만큼 완연하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데카르트의 신학에서 신은 원인의 형이상학 아래 완전히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신은 ‘무한’으로서 그 형이상학으로는 전부 포섭되지 않는 고유의 독특한 성격을 안고 있다.
_“02 데카르트와 백색 신학”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줌으로써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랑의 현상은, 그 안에 어떤 물질적 대상이 개입하더라도 대상화될 수 없는 선물의 현상으로 주어진다. 예컨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관계 안에서나 연인 관계에서 내가 가진 것, 내 신체, 내 삶을 줄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선물이 된다. 이는 나의 신체적 헌신이나 사랑의 행위가 언뜻 대상처럼 보이는 사물로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마리옹이 드는 예처럼 연인에게 건네는 반지는 사랑의 징표로서 유효하고 상징으로 유효하다. 성적 쾌락을 위해 내주는 내 신체는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쾌락에 유효하며, 이때 그 신체는 소유물로서 가치 평가되지 않는다.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신체는 교환적 상호성의 위상에 이르지 않으며, 이 점에서 경제적 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체적 사랑이나 행위는 가치 교환의 대상이 되는 나의 신체적 노동과 다르다.
_“06 순수한 선물” 중에서
그다음으로 질적 포화가 있다. 마리옹은 이를 ‘우상’으로 정의하면서, 회화야말로 이 포화된 현상 또는 역설의 가장 탁월한 예시라고 주장한다. 마리옹이 드는 예는 다음과 같다. 미술관에서 단체 관람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사람과 날씨로 인해 지치기도 하고, 가이드의 설명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단체 관람객 중 한 명인 나에게는 그림에 대한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다. 그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그림 한 폭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는 아무런 지식도, 예견도 하지 못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질적인 선과 면, 형태, 색감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잃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작품에 사로잡힌다.… 우상으로서 포화된 현상 앞에서 나는 다른 방문자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완전히 개별화된다.
_“08 포화된 현상” 중에서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